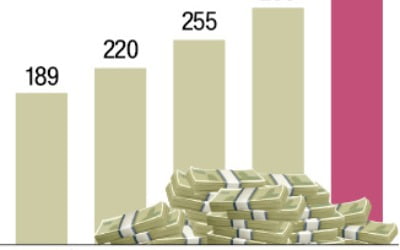-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군인인 배우자와 이혼 과정에서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받기로 했어도 군인연금법 개정안의 효력이 발휘되기 전에 한 합의였다면 무효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군인연금은 직업군인이 퇴역한 후 국가에서 지급받는 연금이다. 중사·상사 이상의 직업군인이 부상·사망하거나 장기복무를 마치고 전역했을 경우 지급받는다. 1963년 1월 28일 군인연금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법 효력 발휘 이전 합의는 ‘무효’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낸 퇴역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원 조정 조항만으로 뚜렷한 근거도 없이 A씨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한다면 분할연금 제도의 요건과 시행 시기 등을 정한 군인연금법 관련 규정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A씨는 군인 출신인 B씨와 2020년 1월 이혼했다. 이때 두 사람은 'B씨의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향후 절차에 따라 분할지급받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10월 국군재정관리단에 연금 분할 지급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관리단 측은 A씨에게 "퇴역연금 분할지급은 군인연금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이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관리단의 결정에 반발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혼 당시 조정 조항에 분할지급 청구권을 포함시킨 취지를 생각하면 연금 분할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연금, 사회보장적 성격 커”
법원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분할연금제도의 성격에 재산권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적 성격이 포함됐음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분할연금 수급권은 군인연금법이 규정한 요건 하에 분할연금 형태로 부여된 공법상의 권리"라며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규정에 따라 2020년 6월 이전에 이혼을 한 사람은 재산분할 또는 법원 판결 등과 무관하게 군인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을 갖지 못한다"고 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